아시아나 B777 여객기 충돌 사고로 다친 피해자나 사망자의 유족은 원칙적으로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피해자들이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전체 손해액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의 보험사가 지급할 보험금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 항공기 사고와 관련한 판례에 근거하면 기장의 과실이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진 경우 조종사가 속한 항공사의 책임이 대부분 인정됐다.
1997년 괌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B747 추락사고가 대표적 사례다.
서울지법은 2001년 당시 사고로 일가족 5명이 숨진 장모씨의 유족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8억6천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대한항공은 국제 항공운송 과정의 손해배상 책임 한도액을 제한한 '바르샤바 협약'에 따라 면책된다고 주장했다.
협약은 손해를 가하려는 의도 내지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 또는 무모하게 행동한 경우가 아니라면 항공사의 책임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사고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장 등의 행위가 단순한 과실을 넘어 면책되지 않는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1993년 66명의 사망자를 낸 아시아나 B737 항공기 충돌사고 때도 조종사 과실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당시 서울민사지법은 사고로 중상을 입은 이모씨와 가족에게 아시아나항공이 95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 "조종사가 무모한 착륙을 시도하고 정해진 규정 고도를 지키지 않은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조사결과 기체나 부품의 결함이 사고 원인으로 밝혀진다면 항공기·부품 제작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괌 추락사고 사망자의 유족이 대한항공과 B747 제작사인 보잉, 당시 문제가 된 부품인 '활공각 수신기'의 제작사 록웰 콜린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길게는 2년까지 걸릴 수도 있지만 손해배상 역시 2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한다는 판례가 있다.
바르샤바 협약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인 3∼10년에 비해 짧다.
이 협약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된다.
1984년 구 소련 사할린 상공에서 발생한 B747 격추사고의 희생자 유족 195명이 1993년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서울지법은 '제척기간'인 2년이 지났고 이미 합의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연합뉴스)
아시아나기 사고 피해배상 법적 책임은
항공사 등 상대 2년 안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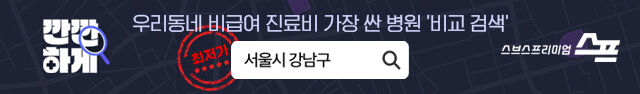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