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해병 사망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전 포병 7대대장 이 모 중령의 동기들이 그제(지난달 30일) 이 중령을 지지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포병 7대대장이 정신과 치료를 받다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채 해병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유력하게 지목되는 해병 간부를 동기들이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선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회피한다"
채 해병의 직속 상관이었던 포병 7대대장은 수색 작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안전장비 없이 예하 중대에 수중수색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장화를 벗어야 한다는 부하들의 건의를 묵살한 혐의까지 있습니다. 포병 7대대장은 경찰 조사에서 "도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책임을 지겠다"며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동기생들도 그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포병 7대대장 동기생들이 입장문에서 강조한 건 선배 장교들의 책임입니다. "사건 10개월이 될 동안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쓴 겁니다. 여기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실종자 수색 작전 당시 함께 있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7여단장, 포병 11대대장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 전 사단장과 7여단장은 각각 해군사관학교 45, 55기, 포병 11대대장은 해병대 사관 88기로 모두 포병 7대대장의 선배입니다.
2024.5.30 해병대 사관 89기 입장문 중
"채 해병의 죽음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 있는 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교범까지 제출한 임성근 "수중수색 지시 없었다"

취재파일①에서 설명드렸듯, 경북경찰청의 채 해병 사망사고 수사의 핵심은 '사건 당일 누가 입수를 지시했느냐'입니다.
이에 대해 임 전 사단장은 경찰 조사에서 "수중수색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며 채 해병 사망에 직접적인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13일 경찰 조사에선 사단장 지시사항으로 전파된 문자에서 '바둑판식 수색' 여섯 글자 외에 자신은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병대 수색부대 전투기술' 교범상 바둑판식 수색은 수중이 아닌 육상에서 한다는 전제가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 2024년 5월 13일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관: 피의자가 바둑판식 수색을 지시한 것은 맞습니까
임 전 사단장: 예, 바둑판식 수색으로 꼼꼼하게 하라는 취지의 '조언'은 했었습니다.
7여단장과 포병 11대대장 역시 포병 7대대에 수변을 전제로 수색을 지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병 11대대장은 수변을 전제로 수색 지시를 받았고, 본인 또한 포병 7대대장에게 똑같이 전파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포병 7대대장 외에 누구도 수중수색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내려갈수록 강화됐던 '수색 지시'…결국 입수
채 해병이 사망하기 전날부터 해병대 1사단 지휘관들이 주고받은 지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병대 수사단 보고서에 따르면, 이 지시를 받은 포병 7대대 본부중대가 경북 예천군 호명면 내성천으로 '입수'했습니다.
<각 지휘관 지시내용 정리>
#7.18 예하부대에 전달된 임성근 전 사단장 지시사항
"경계구역 나누고 책임주고 찔러가면서 확인할 것. 바둑판식 수색정찰 실시" ※이중 본인은 '바둑판식 수색'만 인정.
#여단장
"수변 수색활동이 원칙이고 입수 금지. 의심지역엔 장화 착용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
#포11대대장
"필요 시 허리 높이까지 물 속으로 들어가라"
#포7대대장
"허리 높이까지 수중으로 들어가 수색 작전 실시"
'포병이 특히 비효율적'…간접 압박 정황도

경찰은 포병 7대대장이 최종적으로 입수를 지시한 데에 임 전 사단장이나 7여단장 등의 간접적 압박이 있었는지 보고 있습니다.
수색 작전 첫날이었던 지난해 7월 18일 오전 9시 30분쯤. 임 전 사단장은 경북 예천군 벌방리에 파견된 포병 3대대 9중대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병력들을 왜 투입시키지 않느냐. 빨리 데려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사단장의 수색 지시 강조사항 옆엔 '포병이 특히 비효율적'이란 표현이 붙습니다. 이에 대해 포병 11사단장은 포병 7대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채 해병 사망 당일 07시 20분. 포병11대대장과 포병7대대장의 통화
포병 11대대장 "어제 사단장님이 포병 3대대 가서 화를 엄청 많이 냈대. 발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대 운영해야 하는데… '대대장들. 이 네 말 안 듣냐' 이런 식으로 7여단장한테 말했대."
당시 내성천은 이미 하천과 수변을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범람했고, 곳곳에 물웅덩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지침과 '바둑판식으로 찔러가면서 정성껏 탐색하라'는 지시가 현장에선 모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장 지휘관들은 사단장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해석할 압박을 느꼈을 가능성이 큽니다.
포병 11대대장도 대질 조사 당시 수십 분간 혼잣말을 할 정도로 심리적 충격이 컸다고 변호인 측은 설명합니다.
해병 장교 출신 "나라도 그렇게 했을 것"
수색 첫날부터 포병 대대장들은 예천군 일대 수색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수색 전 포병 대대장들의 단체 채팅방에 포병 7대대장은 "수변일대 수색이 겁납니다. 물이 아직 깊습니다"라고 말했고, 포병 11대대장 역시 "완전 늪지대처럼이라 하루 1km도 힘들겠다"고 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포병들의 철수 건의를 묵살한 정황도 있습니다. 당시 실종자 수색 지휘통제본부장이었던 7여단장은 "애들 강인하게 해야지. 첫날부터 사기 떨어져서 그러면 안 된다"는 취지로 7대대장에게 말했습니다.
채 해병 실종 전날 오후 3시 17분. 포병 7대대장과 7여단장 통화
7여단장 "정식 철수 지시는 상황이 애매해. 사단장님께 몇 번 건의드렸는데. 첫날부터 알잖아."
최근까지 해병대 1사단에서 근무했던 한 장교는 "철수 건의가 이미 거절당한 상황에서 부하들을 입수시키지 않을 방법이 없었을 것"이라며 "자신이 포병 7대대장이었어도 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관의 지시는 목숨처럼 여겨야 한다는 마음으로 10여 년을 해병대에 몸담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직접적으로 '물에 들어가라'고 하지 않았어도, 실종자 수색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단 설명입니다.
한편 경찰은 포병 7대대 간부들의 철수 건의가 누구에게까지 올라가서 묵살 됐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최후 진술에서 "작전 종료 건의를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에게 간 상황에서 "자신에게 건의할 일도 없다"고 했습니다.
임성근 "실체적 진실 밝히려는 것뿐"
지난해 8월 초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던 임 전 사단장. 그에게 경찰에선 당초 발언과 다른 취지로 진술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이에 대해 "여전히 부하들이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적이 없다"고 어제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수사에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건 주요 피의자인 지휘관 4명 중 경찰 수사에서 수중 수색을 지시했다고 인정하는 간부는 포병 7대대장뿐입니다. 다만 상부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았을 뿐이며, 철수 건의도 묵살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주요 피의자인 해병 장교 중 가장 후임만 잘못을 인정하는 상황. 경찰은 공식적으로 남겨진 지휘관들의 지시뿐만 아니라 해병 장교 간 수직적인 문화가 무리한 지시로 이어지지 않았는지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취재파일] ①서둘렀던 해병대 대질…경찰 수사에 쏠린 이목
![[취재파일] ②"입수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선배 장교 저격한 대대장 동기들](http://img.sbs.co.kr/newimg/news/20240601/201939863_128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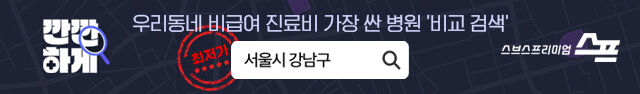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