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도심 속 한옥마을은 옛 정취가 물씬 풍겨서 찾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진도 많이 찍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진 속에 마을 주민들까지 등장한다는 겁니다. 원치 않는데도 말이죠.
임태우 기자가 사진 찍히는 사람들의 고충을 들어봤습니다.
<기자>
한옥 대문 앞 간이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할머니, 목장갑을 끼고 쭈그려 앉아 칼을 가는 할아버지.
수십 년 전 모습 같지만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익선동의 최근 풍경들입니다.
한옥 100여 채가 옛 모습 그대로 남아 있는 이 마을은 젊은이들에게 신세계처럼 느껴집니다.
TV에서나 보던 옛 생활상을 사람들은 카메라에 담기 바쁩니다.
[나들이객 : 저쪽 바깥은 한옥이 아예 하나도 없는데 여길 들어오면 이렇게 다 한옥촌이잖아요. 그 느낌이 되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런 사진은 인터넷이나 SNS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진 속 주민은 할 말이 많습니다.
[익선동 주민 : 나야 가만히 있으면 막 찍어가. (뭐라고 하면서 찍는데요?) 학교라고 하면서 찍고. 그래서 내가 왜 당신들 자기들 마음대로 찍어가고 (사진을) 안 가져오느냐 그랬더니, 안 갖고 온대.]
내 집 앞인데도 시도때도없는 카메라 세례 때문에 맘 편히 쉴 수가 없습니다.
[익선동 주민 : 안 찍으면 좋죠. 안 찍으면. 근데 내가 허리 수술 해가지고 이제 뭐라고도 안 해요. 냅둬요.]
골목길과 벽화로 큰 인기를 끌었던 종로구 이화동이 최근엔 한산해졌습니다.
사생활 침해로 고통받던 일부 주민이 붉은 페인트로 벽을 덧칠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화동 주민 : 밤에 나가서 장사하는 분들이 있거든. 낮에 자려고 하니까 떠들어서 여기 주위 사람들이 말해서 (벽화를) 지웠어. 지금 사람 오나 봐요? 하나도 안 와.]
누군가 생활하는 공간을 감상하고 즐길 거리로만 여기고 있진 않은지 함께 생각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영상편집 : 우기정, VJ : 이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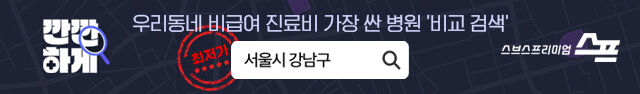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