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다 보니, 정책당국자도 언론이나 전문가들도 답이 어렵거나 본인이 내기 힘든 결론에는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공론화 절차를 거친 사회적 합의’를 방안으로 내세운다. 어떻게 보면 합당한 이야기 같으면서도 달리 보면 책임회피로 보인다.
정치가와 행정가는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리더이다. 리더는 결정하고 책임지는 자리다. 대의 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 역시 그렇다. 전문가는 자신이 가진 전문적 식견으로 책임 있는 결론을 내놔야 한다. 이럴 진대, 나중에 후폭풍이 우려되는 결론을 국민에게 위임한다? 보기에 따라선 비겁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른바 사회적 합의는 협의에선 노동정책에 관해, 광의로는 노동을 포함한 경제사회정책 전반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주요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서는 역사적으로 이런 합의의 문화가 발달돼 있다. 원전 문제나, 근로시간 단축을 비롯한 노동현안, 양극화, 증세 등의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해 다양한 협의체로 조정하고 합의해 실행한다.
우리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민이 결정하기로 한 원전 중단여부 결정절차도 독일의 사례를 모방한 것이다. 하지만 크게 다른 부분이 있다.
독일의 경우 시민단체위원회가 한 달간의 토론회를 거쳐 만든 원전폐기 보고서를 메르켈 총리에게 올렸으며, 이 결론을 총리가 그대로 시행했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공론화위원회를 거쳐 시민배심원단의 결정까지 석 달의 기간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독일은 시민위원회의 결론 전에 무려 25년 간 원전 폐기에 따른 산업 영향, 전기요금 인상전망, 신재생 에너지 지원과 확대 방안 등에 관한 광대한 논의를 거쳤다. 그 숙성된 논의를 토대로 시민위원회가 한 달간의 토론 끝에 결론을 내린 것이다.

원전만 그런가. 원전보다 덜 심각한 송전탑, 터널공사에도 민심이 쪼개지고 공사 중단 사태로 주변이 만신창이가 된다. 노사충돌은 변함없이 만성파업을 부르고, 쌍용차 사태는 지금도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노동현안을 풀기 위해 거창하게 시작하는 노사정위원회는 항상 파국으로 끝난다.
이 대목에서 일제가 우리 역사를 폄하하기 위해 과장한 조선 사대부들의 당파싸움이 떠오른다. 많은 부분이 왜곡됐다고 하지만, 지금의 현실을 보면 개운치 않은 느낌이 든다.
우리나라는 유독 갈등이 심한 나라다. 한 민간 연구소는 한국의 갈등지수가 OECD 국가 가운데 종교분쟁을 겪고 있는 터키에 이어 두 번째로 심각하며, 사회적 갈등에 따른 손실이 연간 최대 246조원에 이른다고 분석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그만큼 합의가 어려운 나라다. 단순하게 유럽이 그렇게 잘 했으니 우리도 따라 하면 될 것이란 논리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대로 멈추는 것은 더 안 된다. 지금까지 안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 될 거라는 논리는 맞지 않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수많은 갈등을 겪었고 안 됐기에, 이제 제대로 될 때가 오고 있는지 모른다.역사에는 지름길이 없는 듯하다. 남들이 겪을 걸 피해가면 좋으련만, 길든 짧든 겪게 된다. 우리가 압축 성장을 이뤘듯, ‘갈등의 길’은 구간을 줄이고, ‘합의의 길’을 넓혔으면 좋겠다.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 여부를 논의할 공론화 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한다. 많은 한계가 엿보이지만, 정말 우리에게 부족하고 선례가 별로 없는 사회적 합의의 모범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목전에 다가온 증세나 일자리 나누기 같은 민감한 현안을 매끄럽게 풀 수 있는 윤활제가 되기를 바란다.
![[칼럼] 사회적 합의가 만능? 리더의 책임 회피 경계해야](http://img.sbs.co.kr/newimg/news/20170720/201072457_128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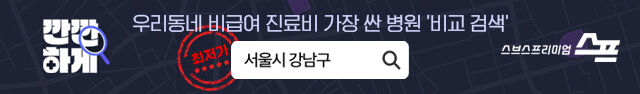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