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의 이런 움직임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긍정적이다. 시민단체 등 재야에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현역 의원들에 대한 실망이 큰만큼 더민주 발(發) 현역의원 물갈이는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으로 파급되고 각 당이 자당의 총선 승리만이 아니라 우리 정치 수준의 한 단계 발전을 위해서도 보다 과감한 공천혁신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현역 의원을 배제하고, 그 자리를 정치 신인으로 채우는 것을 ‘혁신’으로 평가한 것이다.
이런 평가 때문이었을까? 20대 총선에서 150석에서 많게는 180석까지 노린다는 새누리당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새누리당 현역 의원들은 더민주의 컷오프 대상 발표와 외부 인사 영입을 지켜보면서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화답하듯 이한구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은 현역 의원 중 공천에 배제되는 숫자가 예상보다 많을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현역 의원 물갈이. 어떤 이들에겐 칼이 되고, 어떤 이들이겐 기회가 되기에 이해관계는 복잡하고 첨예하다. 그러나 어김없이 선거 때 마다 고장 난 카세트 플레이어처럼 “현역 의원 물갈이”는 여야, 정치권, 시민단체 구분 없이 외친다. 승리를 위한 전략이자, 직전 선거 결과에 대한 불만족, 고인물에 대한 불안감, 자기반성, 기성 정치에 대한 혐오감이 종합적으로 표출된 것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부는 “새로우면 다 좋아 보인다는 착각, 구관이 명관”이라며 현역 의원 물갈이 논의가 공허한 울림에 끝날 것이라고 냉소하지만, 다른 쪽에선 ‘공천 혁명’이라는 단어가 상징하듯 긍정 일색이다.
●‘물갈이' 편견…야당의 카드?? NO !!
SBS 데이터저널리즘팀은 역대 선거에서 ‘혁명’으로까지 불리는 현역의원 물갈이 폭을 전수 분석했다. 분석은 역대 선거 지역구 당선자 중에서 초선 의원 숫자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마부작침] 역대 지역구 의원 당선 횟수](http://img.sbs.co.kr/newimg/news/20160308/200921156_1280.jpg)
보궐 선거를 제외하고, 역대 총선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의 합계는 3,837석. 이 중 다선 의원 등 중복된 의원을 1명으로 계산하며 모두 2,119명이 지역구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2.119명 대(對) 3,837석. 이 수치로 국회의 인물 다양도를 가늠할 수 있다. 제헌국회 선거(1948)부터 19대 총선(2012)까지 역대 지역구 의석은 3,837석을 2,119명이 나눠 앉았다는 뜻이다. 의석 수 대비 당선자 숫자, 인물 다양성 정도로 정의할 수 있는 비율은 55.2%. 이것을 보면 국회의원들은 한번 국회에 입성하면 평균 재선 정도는 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국회 입성을 꿈꾸며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하고 있을 정치 신인들에게는 반가울 소리다.역대 결과를 보면, 이번에 금배지를 달면 21대 총선도 당선될 가능성이 크니 말이다. 하지만, 평균은 항상 진실을 가린다. 역대 지역구 당선자 2,119명을 선수(選數)별로 분류했다. 그 결과 국회의원을 한 번만 한 사람은 1172명, 재선은 489명, 3선 이상은 458명으로 초선에 그친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국회의원에 당선되더라도 다음 총선에 떨어지거나 아예 다시 공천 자체를 받지 못 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이야기다. 이는 매 총선마다 현역 의원 물갈이가 시대의 구호처럼 등장하는 현실에서 영향력이 약한 초선의원들이 희생양이 되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역대 총선별 초선 의원 비율을 보면 특이한 점이 발견된다. 민주화 이후에 실시된 13대 총선(1988)부터 최근 19대 총선(2012)까지를 보면 홀수 총선이 짝수 번째 선거보다 상대적으로 초선 의원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마부작침] 역대 총선 초선의원 비율](http://img.sbs.co.kr/newimg/news/20160308/200921148_1280.jpg)
13대 총선 지역구 초선의원 비율은 50%로 14대(33.8%)보다 높았고, 15대(41.5%)와 17대(56.4%)는 각각 16대(38.8%)와 18대(36.3%)보다 높았다. 대체적으로 정권 초반이나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 실시된 총선에서 물갈이 폭이 다른 총선에 비해 컸다. 정권 후반부, 짝수 총선인 20대 총선도 지금까지의 패턴을 따르게 될까?
정당별 사정은 어땠을까. 물갈이 폭은 여당이 더 컸을까, 아님 야당이 더 컸을까? 단순히 생각하면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한 야당이 놓친 민심을 잡기 위해 새로운 인물을 더 많이 등용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인적 쇄신을 기반으로 재도전하기 위해 물갈이 폭이 여당 보다 더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분석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명박 대통령 재임 때인 2012년 19대 총선.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지역구에서 당선자 127명을 배출했다. 이 중 초선 의원은 54명으로 초선 의원 비율은 42.5%로 집계됐다. 기존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물갈이한 결과였다. 반면,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지역구 당선자 106명 중 초선 의원은 36명으로 초선 의원 비율은 34.0%로 집계됐다.
●여야 확연한 차이…18대 총선 與46.6% vs 野12.1%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이 격차가 훨씬 컸다. 18대 총선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를 5백 만 표 이상의 압도적인 차이로 누른 17대 대선이 있은 지 불과 4개월 만에 실시됐다.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절반 가까이가 초선으로 채워진다. 131명의 당선자 가운데 초선 의원은 61명으로 초선 의원 비율은 46.6%였다.
![[마부작침] 15-19대 여당/야당 초선의원 비율](http://img.sbs.co.kr/newimg/news/20160308/200921149_1280.jpg)
한편, 야당은 대선에서 참패하고 통합민주신당에서 통합민주당으로 간판까지 바꾸고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다. 하지만, 결과는 역대 총선 중에서 손에 꼽힐 정도의 참패였다. 18대 총선에서 야당인 통합민주당이 차지한 지역구 의석은 66석, 한나라당의 절반 수준이었다. 특히, 당선자 중 초선 의원 비율은 12.1%로 한나라당의 1/4 수준이었다.
초선 의원 비중이 각 정당의 정치 개혁 의지 또는 기성 정치인의 기득권 배제 의지를 100% 완벽하게 반영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새로운 인물을 더 많이 공천했지만, 선택받지 못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초선의원의 당선 비중이 각 정당의 물갈이 의지, 정치 신인 등용의 의지를 가늠할 수 있다고 진단한다. 뚜렷한 지역기반을 가진 지역주의 선거 구도에서 각 정당별로 당선이 용이한 지역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감안했을 때 초선 의원 비중이 낮다는 건 정치 신인을 공천에서 배려하지 않은 결과로 해석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선 의원 등 유명 정치인을 험지에 출마시키고, 정치 신인을 지지 기반이 공고한 지역에 출마시켰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바꿔 말하면 현역 물갈이 의지가 적었던 반면, 기성 정치인의 기득권 유지가 강하게 작용했다는 뜻이다.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기록한 46.6%라는 초선 의원 당선자 비율은 친이(명박)계의 친박(근혜)계에 대한 공천 학살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부풀려진 결과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46.6%에 비해 야당의 12.1%라는 수치는 야당 참패라는 결과에 빗대어 볼 때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서양호 두문정치연구소 부소장은 “17대 대선 참패로 18대 총선 당시 야당은 패배주의가 팽배해 있던 시절”이라며 “당내 확실한 리더가 없던 상태에서 치러진 18대 총선은 계파 간 세력 지키기에 급급해 공천 혁신이라는 것이 이뤄지지 않았고, 그것이 총선 참패로 이어졌다”고 평가한다. 이런 평가는 18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야당의)공천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왔던 것과 일맥상통한다. 즉, 대선에서 역대 최다 표 차이로 패배하고도 정치 신인의 과감한 기용 등 민심을 잡으려는 노력을 등한시 한 결과 야당은 총선 패배를 자초했던 셈이다.
●물갈이…여당의 승부수!!!
여당보다 야당의 초선 의원 비율이 낮았던 건 18, 19대 총선에서만 나타난 예외적 현상은 아니었다. 최근 4개 총선, 즉 16대~19대 총선까지의 결과를 봐도 여당(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은 야당(한나라당, 통합민주당, 민주통합당)보다 지역구 당선자 중 초선 의원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19대 여당 초선의원 비중은 평균 49.3%로 야당 34.3%보다 15%P 높게 나타난 것이다.
단적으로 16대(2000)와 17대(2004) 총선에서도 각각 여당이던 새천년민주당(김대중 정부)과 열린우리당(노무현 정부)은 지역구 당선자 중 초선 의원 비율이 49%와 72%를 기록해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 41%와 51%를 압도했다.
이런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존재를 대표적 이유로 꼽는다.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는 “집권 여당에서 누구보다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존재하고, 총선에서 대통령은 직간접적으로 공천에 관여해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집권 여당의 초선 의원 비율이 높은 것은 대통령 주변 사람이 대거 공천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말한다. 18대 총선(2008)에선 친이명박계 인사들이 대거 국회에 들어 온 것, 17대 총선(2004)에서 친노무현계 인사들이 대거 국회에 들어온 것이 단적인 예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또 야당의 초선 의원 비중이 낮은 것에 대해선 “야당은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의원들 간의 연합체적 성격이 강하다”며 “정치 신인을 중용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권력을 가진 누군가가 기성 정치인들의 기득권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데 연합체적 성격을 띤 야당은 이것이 구조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여당은 기존 의원을 대거 물갈이할 수 있는 강력한 구심점이 존재한 반면, 야당은 그렇지 못했다는 뜻이다.
여의도 입성을 꿈꾸는 정치 신인들은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다. 초선으로 당선되기 위해선 야당 소속인 게 유리할까, 여당 소속인 게 유리할까.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신념, 방향성과 일치하는 정당을 찾는 것이다. 다만 앞서 밝혔듯 최근 4회 총선을 볼 때 여당 초선 의원 비중이 높았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15대(1996) 총선까지 시기를 확장해보면 정권 임기를 전,후반으로 나눴을 때 정권 초반 실시된 선거에서는 여당, 정권 후반 실시된 선거에서는 야당 초선 의원 비율이 비교적 높은 양상을 띠었다. 또 때를 기다리고 있는 정치 신인이 있다면, 홀수 총선이 짝수 총선보다 초선 의원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홀수 총선을 노려보는 게 낫다.
서양호 두문정치연구소 부소장은 “정권 초반에 실시되는 총선은 대통령을 배출한 당에게 힘을 실어주는 경향이 강하고, 정권 후반에 실시되는 선거는 ‘정권심판론’이 주로 힘을 발휘하는데, 이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당선’만 놓고 본다면 정권 초반에 실시되는 총선에서는 여당 소속, 정권 후반일 때는 야당 소속일 때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해석이 '정치 신인 자신'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공천을 받는 게 우선이겠지만.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분석: 한창진·안혜민(인턴)
디자인: 임송이
※ 마부작침(磨斧作針) :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방대한 데이터와 정보 속에서 송곳 같은 팩트를 찾는 저널리즘을 지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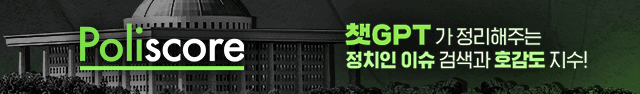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