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경제국들, 무엇이 문제였을까?
2000년대 초에 다시 신흥국으로 돈이 몰리기 시작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인 2004년에서 2008년 사이에 신흥국들은 유럽보다 높은 경제 성장율에 이자율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거품을 키워가던 세계 금융자본이 투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돈이 밀려드는 상황에 직면한 신흥국들은 당시 큰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다. (1) 높은 금리를 유지해 해외자본을 계속 더 유치할 것인가? 아니면 (2) 금리를 낮게 가져가 국내 경기를 더 활성화시킬 것인가?의 문제였다.
첫번째 선택이 불러온 결과는 투기성이 강한 외국자본의 유입이었을 것이다. 해외자본이 들어오면서 자국 통화가치는 높아지게 된다. (해외자본이 해당국 화폐기준의 자산을 사들이며 나타난) 환율절상은 수출 경쟁력에는 타격을 주게 된다. 두번째 선택, 즉 금리를 낮춘 국가들은 해외자본에겐 매력이 떨어졌지만 수출경쟁력은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저금리가 계속되면서 물가상승을 부추겼고, 국내 은행대출이 과도하게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1997년의 아픈 경험이 준 학습효과 때문인지 많은 신흥국들은 두번째 방법을 택했다. 금리를 선제적으로 낮게 유지해 '핫머니'들의 유입을 줄였던 것이다. (하지만 중국과 브라질은 제3의 방법을 택했다. 바로 유입되는 해외자본을 국가가 통제하는 방법을 활용해 수상한 외국자금의 유입에 대한 우려없이 금리 정책을 자유롭게 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의도적인 저금리 상황 속에 신흥국들의 국내 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다. 더 이상 대출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다시 등장한 것이 외국자본이었다. 대출사업을 위해 해외자금이 신흥국들로 다시 몰려들었던 것이다. 이 돈은 2011년부터 시작된 미국 양적완화 정책으로 발행된 새 지폐들이었다. 한국 돈으로 환산해 4천 조원이 넘는 돈 가운데 상당한 액수가 신흥국 대출시장에 뿌려졌다. 결과적으로 신흥국들 입장에선 조심했지만 또 해외자본을 끌어안고 있는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버냉키의 예고에도 느긋했던 신흥국들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기회는 지난 해 하반기였다. 버냉키 미 연준의장이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을 때는 9월이었다. 이 때는 월 스트리트의 금융회사들 뿐아니라 신흥국들도 자금유출 가능성에 대비한 통화정책을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이었다. 올 1월부터 실제로 미국이 돈 줄 죄기에 들어갈 때까지 금리를 올리는 등의 정책전환을 시도한 국가는 드물었다. 그리고 이제서야 신흥국들은 자금유출을 막기위해 금리를 급격히 올리는 중이다.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둔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통화가지 하락을 막기위해 고육지책을 쓰고 있는 것이다.

월 스트리트의 시선 "불안은 계속될 수도"
하지만 미국은 출구전략을 거침없이 본궤도에 올리고 있다. 당연했던 것이지만 신흥국들은 놀라고 있다. 미국 통화정책의 기준은 엄연히 미국경제였던 것이다. 야속하게도 미 연준은 '신흥국들의 금융불안은 테이퍼링보다는 해당국가의 대외불균형 등 국내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월가의 투자은행들도 마찬가지였다. 월가는 신흥국들의 위기조짐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 "미국의 통화정책이 신흥국들의 위기를 고려한다면 그것은 그 위기가 미국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위험을 느꼈을 때일 뿐이다"라고 월가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골드만 삭스'는 현재 브라질과 남아공, 터키 등의 경우 추가적인 통화긴축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더 확보해야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인도, 인도네시아, 칠레의 경우 환율 조정이 충분히 이뤄졌지만 이들 국가들은 추가 약세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긴축으로 대외불균형을 해소하면서 나타나게 될 저성장 문제를 정책적으로 극복해야하는 숙제가 닥쳐오게 된다.
'시티금융그룹'의 경우, 최근의 신흥국 금융불안은 중국경제 경착륙의 우려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것은 더 심각한 분석이다. 중국 경제가 재편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전까지는 불안이 쉽게 진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시티은행의 이런 전망은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중국경제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었던 작년 하반기와는 달리 미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중국에 대한 우려가 커진 올해 초에 신흥국들의 위기가 시작된 점에 주목한다는 것이다.
선진국으로도 확산될까?
신흥국 불안의 선진국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도 월가는 느긋하다. 대체로 중국의 경기회복세가 크게 낮아질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JP모건'의 경우, 위기의 여파가 세계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는 입장이다. 2000년 이후 신흥국들의 채권과 선진국의 주식가격의 동조현상이 커져왔기 때문이다.
월가는 현재로서는 경제 연착륙에 대한 중국 정부의 능력에 큰 의문을 갖지 않고 있는 분위기이다. 만약의 경우라지만 중국의 성장세가 위축된다면 어떻게 될까? 신흥국들의 위기가 본격화됨은 물론 선진국 중에서는 호주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모건 스탠리'의 분석이다. 또 한편으론 위기의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척도로 의외로 '엔화가치'가 월가에서 주목받고 있다. 일본 정부의 엔저 지속의지에도 불구하고 '엔-캐리 투자자금'이 역류하면서 엔화가 강세로 변할 경우에는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뚜렷한 징조라는 것이다.
![[월드리포트] 신흥국 금융불안…월 스트리트의 눈은 차갑다?](http://img.sbs.co.kr/newimg/news/20130123/200638680_128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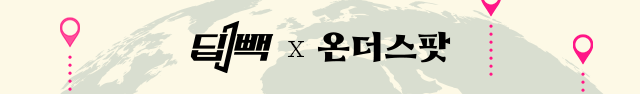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