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름 휴가철 맞아 외국 여행 준비할 때 고민거리 가운데 하나가, '여행 도중 아프거나 다치면 어쩌나?'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행 도중 현지 병원을 찾았다가 치료비 폭탄을 맞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먼저 그 실태를 송인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활주로에 착륙한 여객기에 특수 이송 차량이 접근합니다.
비상문이 열리고, 이동식 침대에 실린 응급 환자를 리프트로 옮겨 싣습니다.
자녀와 함께 일본에 온천 여행을 갔다가 뇌동맥이 파열된 70대 환자입니다.
현지 병원 응급실로 실려 가 큰 수술을 받았는데 열흘 입원비까지 합쳐 4천만 원이나 됐습니다.
국내 이송을 위해 비행기 좌석을 6개 이상 확보하고, 현지로 응급 의료팀까지 파견하면서 1천만 원 넘게 추가로 들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단체 여행자 보험에 들긴 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해외 응급 환자 가족 : (보험사에서) 상해는 최고가 3백만 원이라는 소리만 하고, (질병)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하루에 보통 몇백만 원씩 추가가 되는데, 병원비가 부담이 너무 되니까.]
그나마 직항 노선이 있는 이 환자는 나은 편. 직항이 없는 곳에서는 억 단위의 돈을 주고 경비행기를 빌려야 합니다.
중국은 비록 가깝긴 하지만 여행 도중 사고나 질병으로 입원하면 황당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현지 병원이 갖은 이유를 대며 환자 이송에 협조해주지 않는 겁니다. 현지 병원에 오래 머물게 할수록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김호중/순천향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 (중국에서는) 예치금을 1천~2천만 원 정도를 넣어놓고, 하루나 이틀 후에 또 예치금을 넣으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병원과) 싸우기도 하고 (환자가) 답답해서 울기도 하고.]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해외 응급 환자를 국적기에 태워 국내로 이송한 건수만 159건에 달합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이승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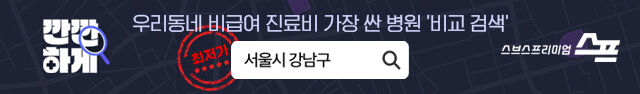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