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의 상징인 전태일 열사(1948~ 1970)도 17살에 평화시장 삼일사에 취직해 봉제노동자로 일하면서 사회 현실에 눈을 떴다. 노동권 향상을 위해 모진 고통을 참아내며 투쟁했지만, 19살이던 1967년 7대 총선에서 투표를 할 수 없었다. 당시 선거가능연령은 20세였기 때문이다. 민주화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전태일 열사도 생전 못했던 투표를 할 수 있는데, 복 받은 사람 또는 행운아라고 표현하는 게 지나치다고 할 수 있을까?

선거가능연령은 시대에 따라 변했다. 1948년 최초의 선거 당시 21세였던 선거가능연령은 5대 총선(1960)부터는 20세로 내려갔고, 48년만인 18대 총선(2008)부터 지금의 19세가 됐다. 시간이 지날수록 선거가능연령은 낮아졌고, 덕분에 선거권 확대가 이뤄지면서 19대 총선 당시 전체 국민 중 선거권을 가진 이들이 79%로 상승했다. 1대 총선 당시 40%에서 2배 가까이 오른 수치다. 시민에게 투표권을 보장하는 건 민주주의의 대원칙이고, 작동원리라는 점에서 선거권 확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는데 이견은 없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것이다.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야 되지 않느냐”. 답은 우리 헌법과 보통선거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 헌법 41조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선언하고 있지만, 헌법상 ‘보통선거’는 인종, 재산, 신분, 성별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평등한 선거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여기에 ‘나이’는 빠져있고, ‘일정한’이라는 조건이 붙어있다. 이 때문에 우리 공직선거법은 ‘나이’에 따라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고, 바꿔 말하면 ‘일정한 나이’에 이르지 못하면 선거권을 가질 자격이 없다는 뜻이다.
이 쯤 되면 ‘19살’은 되고 ‘18살’은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 의문이 생길 것이다. 고작 한 살 차이에 정치참여 능력이 급격하게 발달되느냐? 다독하면서 뉴스를 매일 챙겨보는 고등학교 3학년이 30대 직장인보다 정치적 판단력이 더 건강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문들 속에 18세까지 선거연령을 낮춰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왜 18살까지 확대해야 하는지, 확대해서는 안 되는지 궁금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선 당신은 18세까지 선거연령을 확대하는데 찬성하는가?
[인터렉티브 기사 읽는 법]
-YES(찬성)와 NO(반대)를 클릭할 때마다 다른 기사가 나옵니다. 입장에 따라 클릭 후 기사를 읽어보세요.
#민주주의 역사는 참정권 확대의 역사
‘선거 가능연령 18세 확대’ 찬반 근거 중 한 쪽만 읽은 사람과 양쪽 모두 읽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양 쪽 모두 읽는 게 판단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지만. 찬성하는 입장이든, 반대하는 입장이든 모두가 알고 있어야할 것들이 있다.
바로 참정권 확대이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참정권 확대의 역사였다. 특정 인종에게만 허락되던 선거권이 인종과 무관하게, 남성에게만 허락되던 선거권이 여성에게, 21세 이상만 허락되던 선거권이 19세까지, 이렇듯 민주주의 역사가 깊어질수록 선거권은 확대됐다. 이 말은 입법권자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 선거 가능 연령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고, 헌법재판소 역시 이런 맥락에서 공을 국회로 넘겼다. 즉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선거’로 뽑힌 국회의원들이 ‘선거 방식’을 정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는 뜻이다. 다만 사회현실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게 헌법적 판단이다.

합리적 결정을 위해선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거나, 선거 방식을 도입하는 다른 나라 국가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 2월 선거가능연령을 18세로 낮춰야 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세계 232국 중 92.7%(215국)가 18세 이하를 선거연령 하한으로 정하고 있다. 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는 18세 또는 그 아래로 선거권 연령을 정하고 있다. 다만, 정치 제도는 각 국가의 역사와 사회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각 국가의 특색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성장하고 성숙될 수 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 질문이다.
이 기사를 읽은 후, 당신은 18세까지 선거연령을 확대하는데 찬성하는가?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분석: 한창진·안혜민(인턴)
디자인: 임송이
※ 마부작침(磨斧作針) :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방대한 데이터와 정보 속에서 송곳 같은 팩트를 찾는 저널리즘을 지향합니다.
(SBS 뉴미디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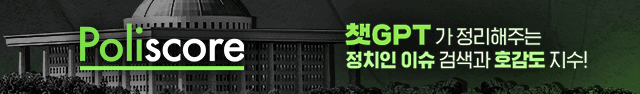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