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安 "과반 정당 후보인 박근혜는 잘했나?"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질문이었던 만큼 안철수 후보도 기다렸다는 듯 답을 쏟아냈습니다. 안 후보는 "반대로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당시, 절대 과반의 의석을 가졌음에도 제대로 국정이 운영되거나 협치가 됐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습니다. 또 "지금으로선 국민의당이 집권해도 여소야대고, 민주당이 집권해도 여소야대."라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집권여당에게 '과반 의석'은 안정적 국정운영을 보장하는 안전판이었습니다. 대선 직후 단행됐던 인위적 정계개편 역시 이런 과반 의석을 만들기 위한 일종의 고육책이었습니다. 과반 의석은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야당의 반대를 뚫고 정책 과제를 관철시키기 위한, 혹은 야당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수단이었습니다.
물론 과반 의석이라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이나 정책은 법사위에 발이 묶이기 일쑤였고 이를 돌파하기 위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라는 비상수단이 동원돼야 했습니다. 이른바 '날치기'라는 정치적 부담이 있긴 했지만 '책임 있는 국정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수권 세력이 정치적 결단을 통해 정책을 집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진다는 측면에서 대의민주주의와도 부합하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정권을 잡았으니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느냐는 게 아닙니다. 권한과 책임이 같이 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지난 96년 김영삼 정부는 노동법을 날치기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대통령은 노동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었지만 국민은 반발했고 결국 그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 결과는 레임덕이었습니다.
● 더 이상 과반은 무의미
지난 2012년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된 뒤 이 과반 의석은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이 엄격히 제한된 결과입니다. 핵심 국정 과제라해도 여야 합의 없이는 국회 본회의 상정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여당이 다수당이라 해도 ‘독단적인 책임 정치’는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물론 전체 의석의 3/5을 차지한다면 가능하지만 우리 정치 현실상 언감생심(焉敢生心)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주장은 여기에 근거합니다. 현재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도 120석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내일(6일) 이언주 의원이 탈당한다고 하니 119석으로 줄게 됩니다. 전체 의석 299석 (원래 300석이지만 1석은 오는 12일 재선거 예정으로 현재 공석입니다.)의 40%가 조금 안 되는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 5개 정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120석), 자유한국당(93석), 국민의당(39석), 바른정당(33석), 정의당(6석) 중 누가 집권해도 국회선진화법 하에서 여당 단독으로는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39석으로 안정적 국정운영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안 후보가 "(소속 정당의 의석 수보다) 대통령이 얼마나 협력이 가능한 사람인지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안 후보는 이를 논리로 "과연 저와 문재인 후보 둘 중 누가 더 협치를 잘 할 수 있는가를 봐야 한다."며 한때 동지였던, 그러나 지금은 최대 경쟁자인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물론 세가 없는 게 자랑은 아닙니다. 의원 수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적은 유권자 지지를 바탕으로 정당을 꾸리고 정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이니 당연합니다. 다만 이 논리를 대선에 그대로 대입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의회 간접 선거가 아니라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됩니다. 대선이 반드시 소속 정당의 규모나 세에 좌우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 그 정파의 이익을 뛰어 넘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입법, 사법, 행정을 나눈 삼권분립의 취지에도 맞습니다. 대통령이 됐으니 소속 정당 따위는 버려도 좋다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그 정당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세가 크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비단 국회에서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도 크게 마련입니다. 싱크탱크를 활용해 다방면의 정책 추진도 가능합니다. 사회 주류를 설득해 일을 추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반면 그만큼 몸도 무겁습니다. 일단 집권하면 챙겨야 할 사람도 많을 테니 말입니다. 자연히 다른 정파와 손을 잡기도 쉽지 않아집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주는 것 없이 도와달라고만 하면 누가 나서서 도와줄까요?
안철수 후보가 "계파주의에 매몰돼 있으면 협력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다른 당의 경쟁자뿐 아니라 같은 당의 경쟁자도 악으로 규정한다면 어떻게 협치가 가능하겠나."라고 지적한 것도 이런 차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파주의에 매몰돼 있다'거나 '같은 당의 경쟁자도 악으로 규정한다' 처럼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겨냥한 정치적 수사를 걷어내고 보면 '대통령 주위에 거대 계파가 자리잡고 있으면 다른 당과의 협치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 "그릇은 비어 있음으로 인해 그 쓰임새가 있다." (當其無 有器之用)
노자 도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땅히 비어 있음으로 인해 그릇은 그 쓰임새가 있다." (當其無 有器之用) 비어 있다는 것 자체가 쓰임새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정치에도 준용할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나를 비워야 다른 이들과 손잡을 여지도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물론 세가 작다고 해서 협치가 잘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중심도 못 잡고 이쪽 저쪽 끌려 다니다 혼란만 가중시킬 위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39석이란 의석 수가 반드시 안정적 국정수행에 걸림돌이나 장애가 되진 않는다는 겁니다.
국회선진화법 하에서 중요한 건 대통령직을 수행할 차기 지도자가 얼마만큼 자신과 자신이 속한 정파의 욕심을 버리고 협치의 자세로 국정수행에 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취재파일] 안철수, 39석이 집권에 장애가 되지 않는 이유](http://img.sbs.co.kr/newimg/news/20170329/201034988_128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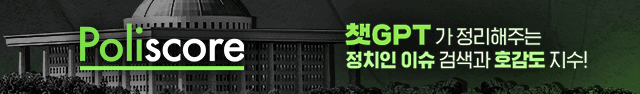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