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더 골라듣는 뉴스룸] 뮤지컬 학회장 고희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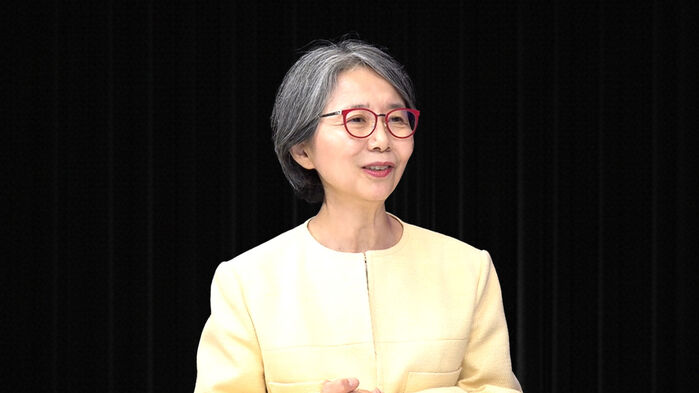
음악극' 벽 속의 요정'은 연극인가 뮤지컬인가? 뮤지컬 넘버가 없는, 이른바 '댄스 뮤지컬'도 뮤지컬이라고 할 수 있나? 뮤지컬의 정의를 둘러싼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한국인 프로듀서가 제작하고 브로드웨이 현지 배우와 스태프들이 참여한 '위대한 뮤지컬'은 한국 창작 뮤지컬일까요?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K-뮤지컬이란 또 무엇일까요? 장르의 경계부터, K-뮤지컬, 창작과 라이선스의 구분, 그리고 '서울 뮤지컬'의 새로운 가능성까지, 뮤지컬의 개념과 정체성을 한국 뮤지컬학회 고희경 초대 회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김수현 기자 : 뮤지컬이 뭘까요?
고희경 뮤지컬 학회장 : 진짜 어려워요. 제가 <뮤지컬의 탄생> 책 쓰면서 뮤지컬을 뭐라고 정의해야 되는가, 뮤지컬은 정의가 어디까지일까라는 고민도 길게 담았었는데, 영어로 스펠링을 쓰게 되면 사실 이 말은 완성된 말이 아니라 '음악적인(musical)'이라는 형용사잖아요. 이제는 뮤지컬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초기에는 뮤지컬 코미디, 뮤지컬 시어터라고 썼거든요.
한글로 '뮤지컬'이라고 쓰면 사람들이 분명히 알거든요. 이게 뭐다라는 개념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m으로 시작하는 'musical'과 한글의 미음으로 시작하는 '뮤지컬'은 개념이 좀 다른 것 같다, 뭐라고 뮤지컬을 볼 것인가 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의 내리는 게 학문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일인데 그걸 해야 학생들도 저희도, 석사·박사 과정까지 있어서 공부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걸리거든요. 기본적인 문제지만 깊은 문제이고, 현장에 있는 여러 가지 논의까지, 해야 될 일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수현 기자 : 뮤지컬이라는 말도 있지만 '음악극'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음악극은 뭐가 다른가.
고희경 뮤지컬 학회장 : 뮤지컬 시어터를 그대로 번역하면 음악극이거든요. 현실적으로 뮤지컬을 뭐라고 할 건가. 예를 들어 시상식이라든지 지원금을 정할 때 '이걸 음악극이라고 봐야 돼, 뮤지컬이라고 봐야 돼' 벽에 부딪히게 돼요.
계속 뮤지컬에 대한 정의가 변화되고 있어요. 제가 책 제목을 <뮤지컬의 탄생>이라고 쓴 게, 계속해서 다른 장르를 폭넓게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큰 의미에서 음악 창극이라든지 오페라까지도 뮤지컬 시어터의 큰 범주 안에 들어올 건데, 오페라는 그래도 분명한 장르적인 성격이 있으니까 그 외 큰 범주 안에서 음악극도 사실 뮤지컬 학회에서 다루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김수현 기자 : 옛날 얘기긴 한데 <벽 속의 요정>이라는 작품이 있잖아요. 그게 어떨 때는 연극상을 받고 어떨 때는 뮤지컬 상에 올라왔는데, 제가 심사를 했던가 얘기를 들었던가.
고희경 뮤지컬 학회장 : 심사 때 저랑 같이 하셨어요. 그게 혼란의 시작이었어요. 어떤 데 가서는 연극이라고 하기도 하고 흥행이 잘될 것 같으니까 뮤지컬이라는 타이틀을 쓰기도 하고, 지원금을 받기는 연극이 용이하거나.
무용도 마찬가지인데 댄스 뮤지컬 같은 경우도 그래요. 매튜 본의 <백조의 호수> 공연 같은 것도 댄스 뮤지컬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인 뮤지컬로 봐야 되는지 혼란이 있고. 이런 혼란을 어떻게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문제를 토론의 장에 올리는 기회가 저희 학회를 통해서 됐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죠.
김수현 기자 : 정의를 지금 당장 '이건 뮤지컬이다' 한마디로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고희경 뮤지컬 학회장 : 맞습니다. 음악, 공연, 연극, 적어도 서너 가지의 장르 또는 학문이 합쳐지다 보니까 뮤지컬학은 간학(interdisciplinary)이 될 수밖에 없는 학문이라고 생각하고요. 학제 간 논의를 좀 더 확대하고 싶다, 그런 플랫폼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수현 기자 : 'K뮤지컬'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얼마 전에 뮤지컬 협회에서 주최했던 포럼에서 박천유 작가가 관련된 얘기를 했잖아요. '자신은 한국 사람이고 한국 정서를 담아서 만들었는데 K뮤지컬이네 아니네 논란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서 섭섭했다'.
K뮤지컬에 대한 얘기를 예전에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연구자도 아니면서 고민하는 주제인데 어떻게 보세요? K뮤지컬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고희경 뮤지컬 학회장 : 그날 저는 '이제 그걸 뗄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한 가지 떼고 싶은 것은, 라이선스 뮤지컬에 대응하는 창작 뮤지컬을 K뮤지컬이라고 하는데, 뮤지컬을 원래 시작했던 미국 사람의 입장에서 그냥 뮤지컬을 하는 하나의 나라이니 그냥 뮤지컬이라고 말하는 게 맞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는 있습니다. '그럼 왜 한국 영화는 한국 영화라고 하는데 한국 뮤지컬이라고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위키드>를 우리나라 배우들이 우리말로 한 거는 한국 뮤지컬인가요? 창작 뮤지컬인가요? 미국 뮤지컬인가요?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되는데 언어의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우리가 라이선스로 우리말로 번역을 하고 우리 배우들이 무대에 섰을 때 이걸 외국 뮤지컬이라고 말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로 인해 배우들의 역량과 창작 역량, 관객의 수준과 뮤지컬 시장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오리지널 팀이 와서 <위키드>를 하고 자막을 보는 공연과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한국 뮤지컬 범주 안에 넣어야 되는데.
정부가 지원하고 뭐 이럴 때는 창작이냐 아니냐 이런 말을 써야 되는 아쉬움이 있는데, <사운드 오브 뮤직>도 사실은 창작 뮤지컬이었던 거잖아요. 그렇듯이 그냥 하나의 뮤지컬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떼고 한국 뮤지컬로서의 정체성. 그렇다면 한국 뮤지컬은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 뮤지컬하고 뭐가 다를까라고 이야기할 때 '브로드웨이 뮤지컬', '웨스트엔드 뮤지컬', '서울 뮤지컬'.
사실 거의 그 수준에 와 있거든요. 비영어권에서 만들어진, 대학로에서 성장한 작품이 토니상을 받는다는 게, <위대한 개츠비>라는 미국 작품을 한국 프로듀서가 완전히 한다는 상황은, 정말 그렇게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되었으니까요. <케이팝 데몬 헌터스> 같은 작품까지 나오니까 뭔가 정리를 해야 된다. 폭넓게, 크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로컬의 경계를 어디로 둘 것인가. 한국이라는, K라는 것의 의미를 뭐라고 할 것인가. 대중음악 신 안에서 K팝이라는 장르적인 정의는 확실히 된 것 같아요. 시작할 때는 어떤 기획사에서 만들어진 거였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은 게 됐잖아요. 그런 가치를 만들어 가는 것도 큰 숙제 중에 하나예요. 한국 뮤지컬, 창작 뮤지컬을 뭐라고 할 거냐, 라이선스는 뭐라고 할 거냐. 산업이 발전하면 또 바뀌게 되더라도 지금의 기준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김수현 기자 : <위대한 개츠비>는 지금 한국에 왔으니 이제 라이선스 뮤지컬이야? 이상하잖아요. 한국 프로듀서가 만든 건데.
고희경 뮤지컬 학회장 : 그래서 지금 협회의 고민이 있습니다. 한국뮤지컬어워즈에 출품하겠다고 해서 심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고 있어요. 신춘수 대표는 내겠다고 하셨대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되나.
김수현 기자 : 한국인 배우들이 출연해서 한국어로 했으면 간단했을 건데.
고희경 뮤지컬 학회장 : 브로드웨이에서 만들었지만 프로듀서가 한국 사람이고, 한국 배우들이 했으면 아무 고민이 없었을 텐데 반대의 경우가 생긴 거예요. 늘 외국 프로듀서가 있고 로열티를 줬는데, 이 로열티는 한국 회사로 들어올 텐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인사이트를 준다고 생각하는 게, 넷플릭스와 소니가 돈 벌고 다 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이제는 다 섞일 수밖에 없는, 경계도 없고. 문화는 그런 게 맞는 건데 더 크게 보면서 더 큰 그림을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김수현 기자 : K팝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한국어로 해야지, 무슨 외국어로 노래를 불러'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영어로 해도 K팝이다' 이렇게 됐어요. 외국 멤버들도. 그러면 K팝 기획사가 제작하면 K팝이라고 했는데 요즘 외국에서도 정말 K팝 같은 그룹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고희경 뮤지컬 학회장 : 'K팝 같은'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K팝이 뭔가' 정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장르로서 확실한 자기 위치를 갖게 된 거죠. 엄청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