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 및 국가 안보 목표 (Economic and National Security Objectives)
2. 상업적 실행 가능성 (Commercial Viability)
3. 자금력 (Financial Strength)
4. 프로젝트의 기술적 타당성 및 준비성 (Project Technical Feasibility and Readiness)
5. 인력 양성 (Workforce Development)
6. 광범위한 영향 (Broader Impacts)
국가 안보 최우선…생산 시설에 접근권?

이번 보조금 지급의 근거는 '반도체 칩 및 과학법 (CHIPS and Science Act)'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무려 2천8백억 달러, 우리 돈 366조 원에 달합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을 확충하고 나아가 연구 개발, 인력 양성 등 관련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통과시킨 법으로, 공급망 확보 차원을 넘어 최대 경쟁국인 중국을 따돌리고 세계 반도체 패권을 유지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법안 서명식 때 중국 견제 의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목표에 걸맞게 미 정부는 보조금 지급의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경제 및 국가 안보'를 꼽았습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이건 근본적으로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이다. 반도체 보조금 지급을 통해 국가 안보 목표를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국가 안보'를 어떻게 고려한다는 걸까요? 국방부 같은 안보 기관에 반도체를 안정적, 장기적으로 공급하고 미 정부가 반도체 시설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것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국가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은 국가 안보 시설에 준해 관리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산업이 그렇지만 첨단 기술로 분류되는 반도체 기업은 기술력이 생명입니다. 우리 나라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산업 보안 시설에 미국 정부가 접근권을 달라는 건 얼핏 무리한 요구로 들릴 수 있습니다. 처음 제 생각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업계 설명은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 나라나 타이완 등 미국에 진출하는 외국 기업은 대부분 파운드리, 그러니까 위탁 생산 업체입니다. 반도체를 자체 설계해 생산하는 게 아니다 보니 생산할 반도체 관련 정보를 위탁 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반도체 정보는 미국 입장에서도 보안 사항입니다. 특히나 국방부 등 안보 기관이 생산을 맡기는 반도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타이완 업체인 TSMC가 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F-22에 들어가는 FPGA 칩을 생산한 게 좋은 예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제공한 기술이 혹여 유출되는 건 아닌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건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생산 시설에 대한 접근권을 요구하는 것이란 겁니다. 물론 아무리 미국 정부라고 해도 외국 기업의 생산 관련 기술까지 들여다 볼 수는 없다는 건 당연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얘기였습니다.
초과 이익 공유…이익 많이 남길 생각 마라?

이번 공고문에서 가장 눈길을 끈 건 초과이익 공유였습니다. 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2천억 원 이상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미리 제출한 재무계획에서 예상한 것보다 많은 이익을 낼 경우 초과 이익의 일부를 미국 정부와 공유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미국 정부가 이런 지침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사회주의적 색채가 강한 '초과이익 공유'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초과이익 공유에 이런저런 전제 조건들이 붙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초과 이익 공유(Upside Sharing)는 ①'오직 예상을 상당히 초과하는 현금 흐름 또는 수익이 있는 경우에 중요'(will only be material in instances where the project significantly exceeds its projected cash flows or returns)할 것'이고 ②'직접 지원금의 75%를 초과하지 않을 것(will not exceed 75% of the recipient's direct funding award)'이며 ③' (초과이익 공유) 협정이 (각 기업의) 프로젝트별로 다를 것이고(arrangements may vary by project)' ④예외적인 경우 면제될 수 있다(in exceptional circumstances, may be waived)'고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초과 이익 환수는 예외적인 경우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협정은 개별 프로젝트별로 맺게 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국내 한 반도체 업체 관계자는 이번 공지에 대해 크게 놀라지 않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이슈는 없었다면서 초과이익 공유 역시 대략적 내용은 알고 있었음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초과이익 공유가 부담이 될지 아닐지는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초과이익 공유 조항은 대기업보다는 현금 흐름이나 이익을 축소 신고할 가능성이 높은 중소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액의 세금을 기업들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 국민 감정을 감안해 퍼주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 주려는 일종의 정치적 장치라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사실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미국 정부가 유치하려는 대상은 몇몇 대기업에 불과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익 많이 남길 생각 말라'며 빡빡하게 굴 경우 오히려 미국 정부가 난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를 감안해 공고에 이런 조항을 넣기는 했지만 실제 개별 기업과의 협약에서는 느슨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다고는 해도 보조금을 받는 기업 입장에서 이런 조항이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이 외에도 경제적 약자 고용이나 보육 제공 같은 여러 조건을 제시했는데 현지 언론들은 이런 과도한 요구 때문에 반도체 공장 유치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알맹이 빠진 공고…우리에게 중요한 건 '가드레일'

이번 공고가 나온 뒤 언론에서는 많은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고에서는 알맹이가 빠졌다는 게 정부나 기업 관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한 관계자는 '이번 공고 내용 가운데 별로 새로운 게 없다 보니 이익 공유나 그런 게 부각된 거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미국이나 국내 기업 모두 똑같이 적용되는 조항은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그토록 논란이 된 것도 사실 북미산 조립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도록 한 차별적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나 기업이 걱정하는 건 중국 내 공장을 운영 중인 우리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이른바 '가드레일', 안전 장치 조항입니다.
보조금이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미국 정부가 규제하겠다는 건데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향후 10년 동안 중국 등 우려국가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대하지 않아야 하고 우려 국가들과 공동 연구나 기술 라이선스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큰 골격은 발표된 상태입니다. 이번 공고에서도 이런 원칙을 재확인했는데 우리 기업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미 상무부는 이달 31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기업들에게 어떤 규제가 있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신청하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니 아마도 이달 안에는 가드레일 세부 내용을 내놓을 걸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전기차와 달리 반도체는 기술력을 갖춘 우리 쪽에도 협상력이 있어 미국과 조율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 때 중국 내 우리 기업들이 유예조치를 받은 게 그런 예입니다. 정확히 이런 이유 때문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한 업계 관계자는 미 정부가 일부 내용을 조율 중이어서 이번 발표에서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궁극적으로 중국 내 공장을 철수하라는 게 미국의 요구라고 말합니다. 동맹국이자 미국 내 투자를 주도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당장 중국 내 공장을 철수하라고 할 수 없으니 말미를 주는 것일 뿐 메시지는 명확하다는 겁니다. 미국이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자국 반도체 장비 업체들에게 거대 시장인 중국을 포기하게 만든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 견제가 목표인 만큼 중국이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의 반도체는 중국 내 우리 기업들에게도 만들 수 있게 해주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낄 수밖에 없는 걸까요? 우리 반도체 업계에 '미국이 없으면 만들 수가 없고, 중국이 없으면 팔 데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반도체 원천 기술은 사실상 미국이 독점하고 있어 미국과의 협력 없이는 현실적으로 반도체 생산은 불가능합니다. 일본이 일부 반도체 소재 수출을 통제한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반면 우리 나라 반도체 수출의 40% 가량이 중국 시장입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이런 걸까요? 한탄만 하기에는 현실이 너무 엄중합니다.
![[월드리포트] 미 보조금 공고에 '화들짝'?…진짜는 지금부터](http://img.sbs.co.kr/newimg/news/20230305/201757952_128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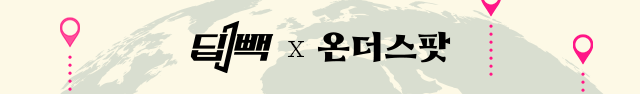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